낮에는 교사로, 저녁은 작가지망생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수요쌤이예요!
'쫑아키우기'가 어느덧 3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글쓰기의 기술보다 조금 더 복작복작하고 치열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저, 즉 공동 육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자 글을 쓸 때도 막막한 순간이 참 많은데,
여러 명이 합을 맞춰 하나의 세계관(책)을 완성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마치 육아관이 서로 다른 엄마 아빠가 만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한 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공저에 참여하면서 그 비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처럼 공저를 준비하며, 혹은 팀 프로젝트를 하며 막막해하실 분들을 위해
<실패 없는 쫑아 키우기 4단계 : 공저 기획 편>을 공개합니다~
1단계: 각자 꿈꾸는 아이의 모습 그려오기
일단, 섞지 말고 각자의 우주를 펼쳐보세요
육아의 시작은 부모가 각자 꿈꾸는 아이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잖아요?
"난 우리 아이가 감수성이 풍부했으면 좋겠어"
"난 논리적이고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처럼요.
공저 기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생각을 하나로 합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제에 맞춰 각자가 상상하는 책의 가장 이상적인 뼈대(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쫑아'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는지 각자의 상상력과 기획력을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합쳤을 때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단계: 육아관 확인하기 (기획 의도 공유)
나는 왜 이 챕터를 여기에 두었는가?
데드라인 전까지 각자 치열하게 고민한 목차를 오픈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도'를 나눕니다.
단순히 "이 목차가 좋아요"가 아니라, "이 꼭지는 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넣었어요." "이 부분은 핵심 이론이라 앞부분에 배치해 기틀을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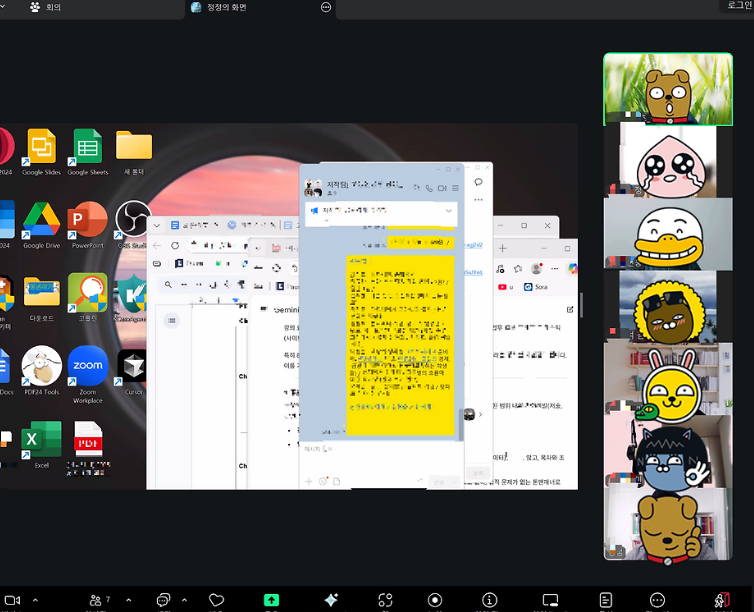
서로의 설명을 듣다 보면 상대방의 '육아 철학(기획 의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부모의 교육관이 같아야 아이가 헷갈리지 않듯,
작가들끼리 서로의 의도를 깊이 이해해야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을 때 잡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3단계: 가장 어려운 '빼기', 알고 보니 '옮겨심기'였다!
부모의 욕심대로 모든 걸 가르치면 아이가 체하듯,
작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욱여넣으면 독자가 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목차를 놓고 나름 냉정한 '조율'에 들어갑니다.
글을 쓰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애써 쓴 내 글, 반짝이는 내 아이디어를 '빼야 할 때'입니다.
전체 흐름과 분량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덜어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저를 통해 저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의 확장입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예요.
'옮겨심기'를 하는 거죠!
책이라는 '메인 화분'에는 그곳에서 가장 잘 생존할 것 같은 씨앗들만 심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밀려난 씨앗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블로그 연재: 책에 싣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깊은 이야기는 블로그라는 '화단'에 옮겨 심어 독자를 만납니다.
독자 활동 (워크북/챌린지): 글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직접 써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텃밭'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빼는 것이 '삭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넓은 곳으로의 '확장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목차를 줄이는 일이 더 이상 아깝거나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챌린지 소재로 쓰면 딱이겠다!" 하며 신나게 옮겨 심게 되더라고요.
이 치열한 토론과 '옮겨심기' 끝에 남은 목차만이 진짜 우리 책의 뼈대가 됩니다.

오잉!? 옮겨심다보니 내 목차에 남는게 없네^^:;
4단계: 옆집 엄친아 벤치마킹하기 (시장 분석)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끼리만 끙끙대면 자칫 '우리만 좋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 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컸대?" 하고 궁금해하듯,
이미 시중에 나와 사랑받는 선배 '종이 아기'들을 함께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책을 소비하는 독자였다면,
'쫑아'를 키우는 작가의 눈으로 본 서점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초보 부모가 놀이터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처럼요.
표지와 제목 (옷차림과 이름): "이 책은 컨셉을 명확히 잡았네. 제목이 독자의 니즈를 건드려."
프롤로그 (첫인상): "첫 장이 참 다정하네. 신뢰감을 주는 방식이 좋아."
목차 (체격): "논리 구조가 아주 튼튼해. 흐름이 자연스럽구나."
롤모델을 보며 우리 '쫑아'의 눈높이를 맞추고,
동시에 우리만의 차별점은 무엇으로 할지 전략을 짭니다.
아류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면서요!
쫑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공저란, 여러 사람이 만나 하나의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치고 조율하는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혼자 쓸 때보다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저의 종이 아기, '쫑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저의 이야기.
앞으로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댓글(0)
이모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