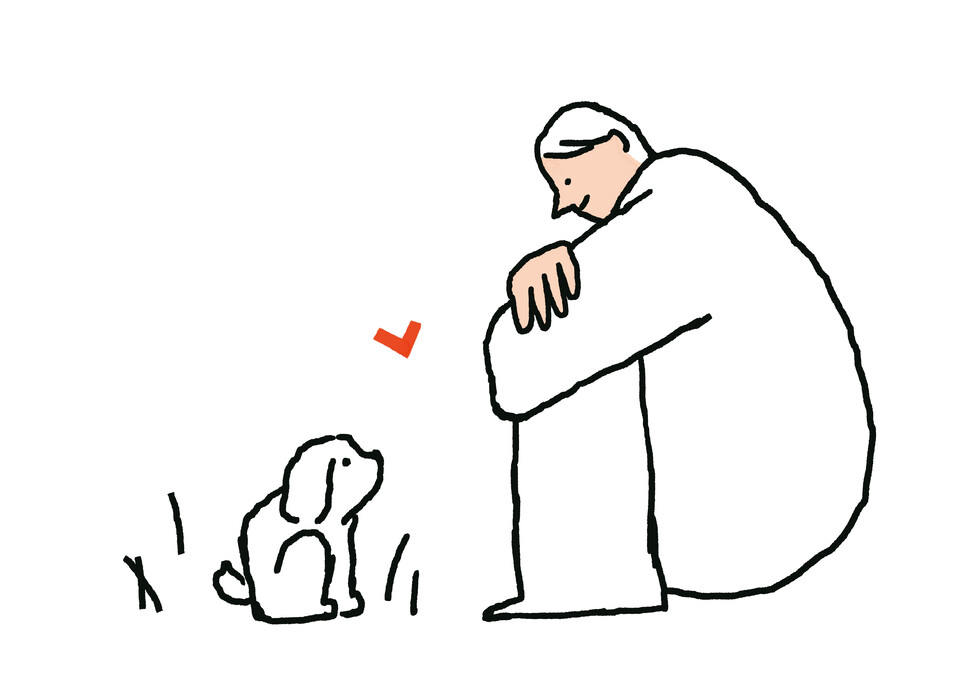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마르타 자라스카의 책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을 보다 생각했다. 이 책에 따르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다. 가족, 친구, 이웃의 튼튼한 지원망이 있으면 사망 위험도가 45% 준다.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6인분씩 먹어봤자 사망 위험도는 26%밖에 안 주는데 헌신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혼 관계는 49%나 낮춘다. 미국에서 벌인 한 연구 결과, 친구나 친척이 별로 없고 결혼하지 않은데다 지역사회 단체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7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 배나 컸단다. 저자가 학술논문 600편 이상을 읽고 과학자 50여 명을 만나 정리한 결과다. 이건 무슨 저주인가. 강제 독거 무언 수행 중인 나는 분명 득도하기 전에 죽을 거다. 남편도 없고, 애인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는 나는 그렇게 가뿐하게 갈 운명인가보다.
왕따당하면 배를 강타당한 듯한 고통
슬프게도, 인간은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면 마음만 외로운 게 아니라 몸도 아프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게 다 스트레스 반응 탓이다. 생존에 필요한 반응이었는데, 현대사회에선 되레 삶을 갉아먹는다. 위협을 느끼면 편도체에 불이 들어오고 일련의 호르몬 연쇄작용이 벌어진다. 뇌 시상하부가 부신피질자극호르몬 한 사발을 토해낸다. 부신은 알도스테론과 코르티솔을 뿜는다.‘코르티솔’ 이름부터 불길하다.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으면 뇌 시상하부가 오그라든단다.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염증에 관여하는 유전자 버튼이 켜지고 항바이러스 관련 유전자 스위치는 꺼진다.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염증이 잘 나는 상태가 된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바소프레신 등 이른바 ‘사회성 호르몬’은 반대작용을 한다. 잔뜩 곤두선 몸을 이완한다. 옥시토신은 염증, 통증을 줄여준다. 이 ‘사회성 호르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껴안고, 춤추고, 노래할 때 나온다. 세로토닌 등은 장내 세균도 내보내는데, 이 세균들의 품질도 관계가 나아질수록 좋아진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남는 건 인간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다.
고독감은 실제로 고통이다. 5천 명 이상이 참가한 한 가상 온라인게임 실험 결과만 봐도 그렇다. 시험 참가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상대 두 명과 온라인 공놀이를 한다. 한 그룹은 가상 상대가 공을 주고받아준다. 다른 그룹에서는 시험 참가자만 쏙 빼고 가상의 두 명끼리만 공을 주고받는다. 시험 참가자들의 뇌를 봤더니, 공놀이에서 따돌림당한 부류의 뇌 한 부분이 활성화됐다. 배를 강타당하는 것처럼 몸에 고통을 느꼈을 때 켜지는 부분이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벌고, 사랑받아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한다. 고독감은 관계를 악화할 확률이 높다. 책에 소개된 한 연구를 보면,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 신호에 더 민감하다. 시험 참가자들은 각각 20초짜리 동영상 8편을 봤다. 4편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우호적인 상황, 4편은 등 돌리고 다투는 듯한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시험 참가자들의 안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고독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동영상에 더 주목했다. 홀로일 때 생존을 위해 경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독한 사람은 더 고독해진다.
남이 나한테 안 해주면 내가 나한테
공원에서 개를 조용히 시키라고 한마디 한 남자에게 흰자위를 드러내며 개처럼 으르렁댄 나는 과잉 경계 상태였던 걸까? 친구가 카톡을 ‘읽씹’ 하면 종일 마음속에서 뭉근한 화가 끓어오르는 건 내 고독감 때문일까?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도 날 무시하냐며 (그나마 다행히) 상상 속에서 멱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그런 거 같다. 이 악순환의 무한 서클을 바꿀 자신이 나는 없다.
내가 맺는 관계에 어떤 유형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한 건 마흔이 다 돼서였다.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 어린 시절 자리잡은 애착관계는 무슨 붕어빵틀처럼 이후 관계도 같은 유형으로 찍어내나보다. 진심으로 바꾸려고 하기 전까지. 그건 마치 뇌를 다시 조립하는 것처럼 더럽게 어려운 일인 듯하다. 억울하다.
그래도 다행히 관계의 황무지를 40년째 작대기 하나 들고 헤매는 나에게도 동방의 현인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현자에게 이 욕 나오는 불공정한 게임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나는 아무래도 자신 없다고. 이렇게 살다 그냥 일찍 죽을 거라고. 만났다면 분명 머리 뒤 후광이 반짝였을 친구가 그랬다.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 희망을 뜻하는 노란색 편지지였어. 내가 나한테 10년 전에 쓰고 회사 타임캡슐에 넣어뒀던 걸 회사 동료가 보내준 거야. 그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어. 나를 믿는다고 쓰여 있더라. 내가 나한테 해준 말도 큰 힘이 되더라. 너도 그렇게 해봐. 남이 나한테 안 해주면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잖아.” 나도 5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친구에게 묻어두겠다고 약속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 한 자도 못 썼다.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다는데도
사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 관계 빈곤자들을 향한 저주는 아니다.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다.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며 친절하게 한마디 더하기, 자신이 관심 가지는 주제로 자원봉사나 그것도 안 되면 기부하기도 마음과 몸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조금 더 평등하게, 조금 더 공감할수록, 조금 더 이웃과 함께하려 노력할수록, 조금 더 지금 삶에 성실할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증거를 수두룩이 보여준다. 그래야 오래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내가 이 책을 ‘저주’로 읽고 싶었던 까닭은 운명 탓을 해야 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나는 바뀔 수 없을 거야’라는 익숙한 절망이 전화 한 통 하기보다 쉬우니까.
“사회성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 인생을 즐겨라.”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이 책은 내게 희망을 하나 줬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솟아난다는, 스트레스를 날려준다는 그 호르몬, 옥시토신은 반려견의 눈을 바라봐도 나온단다. “내 옥시토신 털뭉치.” 개를 보니, 개가 내 장갑을 물어뜯어 구멍을 내고 있다.
김소민 자유기고가
한겨레21 기사 원문보기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9866.html












